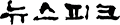[뉴스피크] ❰윤미향과 나비의 꿈❱, 윤미향 지음, 내일을 여는 책, 2023-10-25
지금이 딱 그럴 시기다. 곳곳에서 출판기념회 소식이 들린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출마를 꿈꾸는 이라면 한 권의 책 정도는 쉽게 출간하나보다.
반면에 책이 나왔는데도 정작 자신의 SNS에서도 출간 소식을 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삶을 절절하게 담아 놓고도 자신의 성격마냥 그냥 묵묵히 바라볼 뿐인 사람이 있다. 답답한 마음에 이리 서평이라도 써야할 것 같아 몇 자 적는다.
답답한 저자는 바로 윤미향 의원이다. 올해 10월 25일 발간한 <윤미향과 나비의 꿈>(내일을 여는책)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멀리 남쪽지방에 내려가 강의를 마치고 올라온 직후였다.
예쁘장한 디자인과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시선을 뺏겼다. 하지만 이내 절절한 문장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선 채로 책을 읽다가 그만 먹먹함에 빠져들어야 했다.
윤미향 의원은 여전히 재판 중이다.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결과에도 ‘희망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은 그는 이런 말로 프롤로그를 썼다.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에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라는 말이 겹쳤다.
최근 우리는 한 사람의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뼈까지 물어뜯으려고 무리지어 다니는 하이에나 떼의 출몰을 자주 본다. 사냥감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는 모습을 숨죽이며 그늘에 숨어 보았다. 고작해야 눈물 몇 방울 그들을 위해 흘렸을 뿐이었다.
그 중에 윤미향 의원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삶을 <윤미향과 나비의 꿈>에 담았다.
흔히 말하는 ‘피로 썼다’는 말에 눈물과 한숨, 분노 그 모든 걸 담았을 거라 생각하며 책을 펼쳤다. 그러나 곧 혼란에 빠졌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책을 덮었다.
미안함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교차했다. 한동안 멍했다. 곧 이어 먹먹함이 밀려왔다. 어떻게 견뎠을까.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다. 할퀴어지고 베어지고 온 몸이 상처로 뒤덮혀 피범범이 되지 않았던가. 역사의 뒤안길에 머물고 말았을 나비의 꿈을 끌어냈던 삶인데 그마저 온통 부정당하지 않았던가. 그뿐이랴. 자신을 향했던 발톱이 가족들에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음을 다 지켜보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이렇게 말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윤미향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2쪽) 그래서 고스란히 어깨를 내주고 온 몸을 저주의 발톱 아래 던졌던가. 또 이렇게 말한다.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죄를 짓는 것 같다. 부디 나의 교만함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변호로 읽어주면 좋겠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가장 처음 했던 말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누가복음 23장 34절)’이다. 이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불편하고, 죄를 짓는 것 같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무죄, 무죄, 무죄...’로 끝난 마녀사냥, 제2장 올가미 제3장 할머니들과 함께한 30년, 제4장 나를 키운 것은 8할이 사랑이고 마지막에 최후진술과 어머니의 탄원서가 있다.
검찰·언론의 마녀사냥은 물론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반박하고 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갑자기 가슴이 뛰는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 이유가 조금은 어이없다. ‘단순히 나의 혐의가 벗겨졌기 때문이 아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에서 길원옥 할머니를 ’평화운동가‘로 인정해준 것(46쪽)’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는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부족할 판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길원옥 할머니가 평화운동가로 인정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다니…. 그 이유가 할머니들 옆에 서서 같이 걷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라니 이 사람을 그저 순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 같은 범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제2장에서는 남편 김삼석의 이야기가 담긴다. 어떻게 이 부부의 삶은 이다지도 힘들단 말인가. ‘20년이 지난 2015년에 재심이 받아들여져 간첩 누명은 벗게 되었지만 빼앗긴 시간, 파괴된 가족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고백은 당사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겉표지도 예쁘고 속지도 예쁜 감성적인 일기장을 쓰던 저자가 ‘내 삶에 일기는 없다’고 말하는 그 심정은 더 아프게 다가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모두가 남편을 압박하고 고문하는데 쓰였기 때문이다. 치욕스럽고 미안한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야 비로소 그저 순둥이같기만 하던 저자의 분노를 보았다.
제3장에서 윤미향은 할머니들 얘기를, 제4장에서는 자신의 어린시절과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수원과 인연은 물론이고 한신대로 진학한 이유도 말한다. 김복동 할머니, 강덕경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한 분 한 분 모두 나비로 날아오른 분들이시다. 그리고 윤동주의 ‘별 헤는 밤’에 할머니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다가 마침내 윤미향도 나비로 날아오른다.
이 책은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치지망생들의 출판 소식과는 다르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얼굴 도장을 찍고 저자는 자신의 포부를 펼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일을 왜 시작했는지, 어떻게 오해가 쌓이고 수십 년 쌓아온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지, 평생을 바쳐온 진심이 어떻게 세간에 잘못 전해지는지, 악마화하고 희화화하는 이들이 한 사람의 삶과 주변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바보처럼 담담하게 그저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칠 뿐이다.
책을 다 읽고 그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억울함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게 만들다가 곧 뜨거운 무언가가 속에서 터져나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분노와 슬픔, 무력감과 공포...이런 복잡한 심정에 빠져있는 나를 위로한 건 오히려 그였다.
“나비는 자신의 몸부림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강하다. ‘알에서 유충이 되고 고치를 만들어 숨었다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틀을 깨뜨리고 나와서 날개를 갖고 해방된 세상을 산다.’ 정대협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고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꿈꾸던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주체적인 활동으로 스스로 해방 세상을 열어가는 것, 그것을 표현해내고 싶었다.”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