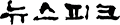거대한 암석과 은근한 해변의 아름다움을 선사한 캐논비치를 등지고 다시 북쪽으로 길을 나선다.
다시 한없는 도로가 이어진다. 왼쪽으로는 막막한 태평양이고, 오른쪽으로는 거대한 대륙이지만, 그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차선 단정한 도로뿐이다. 이제 이 길로 계속 달리면 오리건 주의 끝에 다다를 터이고, 거기서 차를 돌려 숙소가 기다리는 포틀랜드로 가야한다.
마음이 급하다.
스쳐가는 풍경이 아름답지만, 길이 급하니 풍경이 쉽게 담아지지는 않는다. 낯선 곳, 거대한 땅이 주는 초조함이지만, 그래도 자연과 인간이 만든 광활한 풍경은 손과 마음을 풀리게 만드는 법이다.
어느 순간 놀랍게도 긴 방죽이 나타난다.
어디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다.
한쪽 면은 넘실거리는 바다를 면하고 달리고, 그 너머는 현실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다리가 보인다. 그 기묘한 이질감과 아름다움은 판단력을 일순간에 앗아간다.
[사진1] 하늘과 땅 사이에 선이 두 개 그어지고, 그 사이로 사람과 차가 지나간다.
세상에 난 틈이다. 간신히 벌어진 그 틈, 지구라는 별의 갈라진 자국 사이로 전혀 색다른 풍경이 열리는 듯한 환상이 진하게 펼쳐진다. 시간의 관념은 사라지고, 단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아슬아슬한 긴장감만을 돋아줄 뿐이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니, 마치 7, 80년대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패스트푸드점이 이방인을 천연덕스럽게 맞는다. 마침 놀러온 듯한 10대 아이들의 수다를 뒤에 두고, 간단히 요기를 한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와 진한 그림자와 포토샵으로 만든 듯한 푸른 바다와 하늘마저도 생경하기만 하다. 원색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낯선 시간은 이곳 풍경의 기대감을 높여주기에 무작정 높은 곳으로 향해본다.

도시는 바다에 잠식당하기 싫은 듯 불쑥 솟아 있는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언덕은 잘 꾸며진, 고급스러운 주택들로 가득하다.
[사진2] 그 언덕의 집들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고, 그 바다는 또다른 육지를 향해 있다. 사람은 바다를, 바다를 사람을 그리워하는 듯하다. 다만 이런 그리움과 만남이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사진3] 분명 낯설지만, 또한 익숙하기도 하다. 저 언덕의 풍경이 그리 다가오는 것은 우리 어린시절의 문화가 얼마나 미국에 가까운 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저 무작정 지도도 없이 고개를 빙빙 돌고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막연한 친숙함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곡선과 고개의 감춰짐은 기대감이기도 하다. 여행이란 결국 기대감 그 자체이기도 하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휘어지는 고개는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한 힘이 되기도 한다.

[사진4] 고개를 넘어가면 바다가, 다리가 보일까 했지만 또다른 고개와 집과 도로가 보인다. 그게 실망이 아니라 또다른 감동으로 오는 것은 그 풍경 또한 놀랍기 때문이다. 빼곡한 집들이 주는 풍만함과 풍족함. 어린시절 골목길의 구수한 밥냄새와는 조금 다른 여유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개의 정상은 기대감은 시원함이자 만족감이다.
그렇게 언덕 사이를 누비고 다니다보니 어느 순간 바다와 항구 그리고 거대한 다리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에 도착을 한다.

[사진5] 잠시 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 집과 집 사이, 나무들 사이로 바다가 보이고, 그 사이로 다리의 파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곡선이 넘실거리며 저 너머의 육지로 향해 간다. 여기는 오리건 주이지만, 저 너머는 워싱턴 주이다. 날씬한 자태를 뽐내며 초록색의 철근 다리는 숨가쁘게 바다를 넘어가고 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현실감이 없다. 너무 생생하기에 또한 황홀하기까지 하다.
정신없이 그 풍경을 본다. 인간이 만든 풍경도 이렇게 장엄할 수 있구나 감탄이 절로 인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정말 멋있는 풍경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반바지에 편한 복장을 한 남자가 그늘막에 앉아 시원한 것을 마시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렇듯 처음 와서 본 사람뿐만 아니라 항상 자고 일어날 때마다 보는 이에게도 이 풍경은 멋져 보이나 보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풍경은 항상 풍요로운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구나 하는 두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져, 위가 아닌 아래로 내려가본다.

[사진6] 밤과 낮이 한판 대결을 벌이고, 그 치열한 흔적은 아름다운 색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 경계를 사람이 만든 다리가 지나니, 그보다 놀라운 장관이 없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연 그 자체로 놀라운 것보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가 주는 감동이 좀 더 살가운 게 사실이다. 그저 선 하나이지만, 자연에 밀리지 않은 그 규모와 거기에 스며든 노동과 땀이 은근히 느껴지기 때문이리라.
역시 다리의 아래쪽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해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마침 저무는 해가 던지는 빛에 의해 도시의 풍경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한다.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다면 스쳐가는 곳으로 이곳을 잡지 않았을텐데.

[사진7] 거대한 다리 옆에는 집을 받치고 있는 다리도 있다. 짙은 바다와 하늘, 그리고 각진 건물에 비해 그 밑의 다리는 너무 가늘게만 보인다. 그래서 촘촘한 다리의 그림자가 자꾸 눈을 잡아 끈다. 사람들은 결코 육지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가? 넘고, 넘고를 반복하다 결국 살 집마저 바다 위를 고집하는가? 그 집의 벽에는 바다를 가르는 배가 당당하게 새겨져 있다. 이 도시는 바다를 꿈꾸는 도시일 수밖에 없다.
다시 길을 떠난다.
항상 아쉬움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기에 대륙인가 보다.

아스토리아는 영화 구니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고, 에잇빌로우에서도 잠깐 스쳐갔던 곳이다.
미국 최초의 백만장자 존 제이콥 아스토의 이름을 따 지어진 도시이며, 컬럼비아 강 어귀에 있으며 미시시피 서쪽 최초의 미 정착촌이었다. 6.6km 길이의 아스토리아-메글러 다리는 워싱턴 주로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다.
여행안내소 www.oldoregon.com
컬럼비아강 해양박물관 www.crmm.org
사진 김영민, 글 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