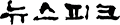가끔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으레 주변에 있는 헌책방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는 그리 낯설지 않다. 좀 서먹하기도 하지만, 대개 주인장들의 성품이 좋아서 그런지 쉽게 익숙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 한 번은 서울의 용산 근방에 일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근처에 자리 잡은 헌책방을 방문하게 되었다. 언제나처럼 반겨주는 주인장과 인사를 건네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이내 추위를 녹이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눈인사를 주고받았다.
한동안 서점 내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좀 두꺼우면서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온전한 몸매가 아니라 겉옷과 바지를 어디에서 잃어 버렸는지, 실로 발가벗은 몸뚱어리만 남은 몰골이 그리 아름답지 않은 형해(形骸)였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른 책장을 열심히 탐색하는데 좀 전의 그 모습이 아른거리기 시작하였다. 아! 이 책이 나를 부르는가보다 하는 생각에 그 책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이동을 하였던 적이 있다.
우리가 헌책을 만나면 요모조모 살피게 된다. 그것은 이 친구를 우리 집 식구로 맞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아마도 깨끗한 친구를 반기는 분은 외모가 좋아야할 것이고, 출생연도를 따지는 분은 꼼꼼하게 그 비밀을 살필 것이고, 다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걱정하는 분은 같은 부류의 친구들을 섭외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것보다는 내내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친분을 우선시하고 있는 편이다.
그날 만난 친구는 진짜 볼품이 없었다. 다른 분들에게 소개시키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지나치게 허름한 그런 친구였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친구가 계속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 속에 담긴 마음씨라고나 할까? 언뜻 보아서 그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아끼고 또 아꼈던 친구였음에 분명하다는 생각에 선뜻 내 식구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한적해제(漢籍解題)』였다. 나이는 처음 태어난 것이 명치 38년(1905)이고, 내가 만난 친구는 대정 8년(1919)에 7판째 찍은 책이니까, 가히 적지 않은 나이임에 분명하다. 그동안 모진 풍파에 견디면서 버텨온 것만도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책은 그 후로도 여러 판을 지속적으로 찍었으며, 내가 가진 또 다른 판본은 소화 49년(1974)에 명저간행회에서 조판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인, 간행한 바 있다. 그러니까 진본(?)과 영인본을 하나씩 소유하게 된 셈이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선 그 분량이 천여 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그 목차를 보면 경(經), 사(史), 자(子), 집(集) 그리고 정법(政法), 지리(地理), 금석(金石), 목록(目錄), 소학(小學), 수사(修辭), 유서(類書), 잡서(雜書), 총서(叢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깨알 같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는 목차만 해도 자그마치 22쪽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어찌 아니 부러울 것이며, 어찌 부끄럽지 않을 손가!

김희만 : 한국사를 전공하였으며, 특히 정치사회사에 관심이 많다.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헌책을 좋아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책방을 뒤지고 다니는 헌책장서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책을 일본에서 1905년에 출판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자료의 수집, 정리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그 노력은 어떻게 헤아려야 할까? 이것을 계 오십랑(桂 五十郞)이 세상에 내어놓은 것이다. 책 서두에 계 호촌(桂 湖邨) 찬술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들의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술과 출판이 같은 가쓰라(桂) 집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시기 또한 주목할 만한데, 바로 일제에 의한 우리의 강제 외교권 박탈이 체결된 을사조약의 해라는 점이다. 비록 이 저작이 한 가문에 의한 작업의 결과일수도 있지만, 그 당시 우리의 지식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반문해 보고 싶다.
책의 내용을 일별해보면, 앞에서 예시한 각 목차에 따른 소서(小序)가 마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사(史)에 대한 내용의 일부분을 인용해 본다.
사는 옛날 천자의 좌우에서 그 언행을 기록하는 자의 관명으로서, 황제(黃帝) 때는 창힐을 좌사로 하였으며, 저송을 우사로 하고, 순제(舜帝) 시절에는 백이에게 전적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하후(夏后)씨 시절에는 태사를 두었으며, 은(殷)에 이르러서 양사(良史) 지임(遲任)이 있는 것을 『상서(尙書)』 반경의 정현의 주(注)에 보이고, 주(周)는 태사, 소사, 내사, 외사, 어사, 좌사, 우사 등의 사관으로서, 각기 그 직임을 분장한다.
이처럼 사(史)의 소서에는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가고 있다. 이어서 그 소 목차에는 정사(正史), 편년(編年), 기사본말(紀事本末), 잡사(雜史), 전계(傳系), 사초(史鈔), 재기(載記), 사평(史評), 연표(年表) 등 역사 전반에 대한 분류와 각각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작자, 체재, 전래, 주해, 참고 등의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대하면서도 자세한 참고 서적이 일찍이 만들어졌다면, 한적에 대해서라도 후학들에게 얼마나 유용하면서 다목적인 서책(書冊)이 될 수 있었을까 자문해본다.
요즈음 옛날 책을 찾는 분들이 점차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시중의 서점에 새로운 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서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옛 책이든 새 책이든 각기 그 쓰임새가 다른 것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문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거운 책도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오래된 책의 진본과 영인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깊고 융숭한 속맛을 느낄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헌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음인 것이다. 헌책방에 가면 책 내음을 맘껏 맡을 수 있다. 이 또한 즐거운 삶이 아닌가?
* 필자 소개
김희만 : 한국사를 전공하였으며, 특히 정치사회사에 관심이 많다.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헌책을 좋아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책방을 뒤지고 다니는 헌책장서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