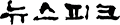잡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처음 일을 배운 것이 잡지이기도 했지만, 잡지 그중에서도 월간지는 책이나 신문에서 얻을 수 없는 감각과 만족을 선사해준다는 나만의 고정관념이 있다.
그래서 가끔 잊고 있던 친구 집을 찾듯 서점의 잡지코너를 순회하면서 그때의 호기심을 충족해주거나, 새롭게 내 시각과 두뇌를 충족시켜주는 잡지를 한 권씩 사오는 게 빠지지 않는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발의 이끌림을 유혹하던 그런 잡지 코너의 매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새로운 잡지는 드물어지고, 익숙하던 잡지는 사라지던가 본연이 활력을 잃어버린 처참함으로 나를 맞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출판의 불황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단행본은 잡지에 비해 나은 편이라는 게 잡지 쪽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한 감각으로 무장한 채 용감무쌍하게 세상을 나온 잡지를 만나면 너무도 반갑고 대견하기도 하다.
그렇게 만난 잡지가 바로 'OFF'였다. 넘버3에서 송강호가 "난 한 놈만!"이라는 말을 유행했듯이, 이 잡지 역시 한 지역만 철저하게 파고든다. 여행을 다녀본 이들은 알 것이다. 한 지역을 집착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음을. 또한 한 지역을 집착하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된다.
그렇게 집착을 다양한 이야기로, 탐닉을 아름다운 사진으로 풀어내니, 가끔씩 찾는 서점에서 오프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오프'가 보이지 않는다. 우편물을 그 잡지사로 보내도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와 버린다. 잡지가 어렵다는 말이 새삼 가슴 깊이 다가온다.
왜 어려운 것일까? 기획의 실패, 영업의 실패?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일상의 분주함과 책과의 거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지 않는 잡지가 성공할리 없고, 서점과 친하지 않은 이들이 어떤 잡지가 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식사회는 어디로 오는가? 오로지 스마트 폰에 목숨을 거는 한국사회가 조금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용감한 잡지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조그만 동네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매거진 B에서 이런 도전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브랜드 매거진이라. 대충 브랜드라는 이름이 걸리면 지나치게 상업적이기 되기 싶다. 그 광고에 의지하는 잡지는 잡지의 고유의 특성보다는 광고주의 기호와 욕심에 이끌려 다니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잡지가 아니라 소위 '찌라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브랜드매거진 'B'는 그런 우려는 피해가는 듯하다. 하나의 브랜드를 집중 취재하고, 거기에 스토리와 이미지를 덧붙여준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좀 더 깊고,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듯한데, 아직은 이야기보다는 이미지에 많이 치중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잡지를 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의 문화와 이미지를 무섭도록 집착하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놓았기 때문이다. 잠시 뜸해졌던 내 발걸음은 다시 잡지 코너를 향하기 시작했다.
잡지들의 도전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도전에서 볼 수 있는 집착과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와 시선의 방법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문득 묻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잡지를 좋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