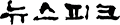일본의 완행열차
여행 중에 잠깐씩 만나는 일본의 생활은 조금 분주하고, 톱니바퀴처럼 짜여 있어 답답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검정색 양복과 와이셔츠의 부대와 뛰면 건너편 벽에 부딪힐 것 같이 작은 비즈니스호텔은 일본 생활의 편리와 간결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저 스쳐가는 여행객에게까지 긴장된 몸과 마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촘촘함과 빠른 이동이 만나다보면 아무래도 여행보다는 출장을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의 한편에 조금 느린 흐름을 적절히 가져가는 재미로 일본의 완행열차를 이용해봅니다. 그리고 느린 열차에는 싹싹하지만 빠르게 스쳐가는 것만이 아닌, 좀 더 내밀하고, 찬찬하게 이 땅과 사람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일본의 열차라는 게 동네마다 다르고, 그 안의 풍경도 어디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학생들의 치기어린 모습부터 아주머니의 편한 듯 분주한 자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찬찬한 관찰까지, 밖으로 지나는 시골의 풍경보다 다채로운 삶의 풍경이 작은 열차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매력적인 게 바로 완행열차인 셈입니다. 도로시는 모래바람을 타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덜컹거리는 열차만 타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다줍니다. 도착한 그곳에는 멀쩡하고도 한적한 신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화의 나라, 일본
어느 나라에도 신화와 전설은 있지만, 일본만큼 내밀하고, 끈질기게 이어지는 나라도 없을 듯합니다. 생생한 증거와 증명 보다는 모호한 신화와 전설에 소위 ‘천황의 나라’라는 일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은 인간일지 모르지만, 종교는 가장 강한 존재로 만드는 생생한 현실인 셈입니다. 한없이 친절하고 예의바른 민족을 가장 거센 사무라이로 만드는 힘도 역시 거기서 기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종교를 만나는 일은 바로 그런 그들의 친절과 거침의 사이를 보는 일이 되는 것이 됩니다.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면 기존의 가치관과 예절을 비웃으며, 파격과 격렬함으로 짧고 굵은 한 세상을 살았던 오다 노부나가 역시 평생 두 곳을 존중했다고 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기원의 심장, 아츠타였다고 합니다. 소설은 노부나가가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상경에 비수를 들이대기 위해 달려 나가는 급박한 순간에, 이곳 신사 앞에서 부하와 다짐을 하는 장면을 굳이 끼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예견되어 있었던 셈이고, 아츠타 신사가 일본인들의 역사와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장소임을 소설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환웅이 있었다면, 일본은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웅의 손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듯이, 아마테라스의 손자가 일본 땅으로 내려오고天孫降臨천손강림, 그의 후손神武天皇진무천황이 야마토 국을 건설하면서 일본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곳 아츠타 신사가 중요한 곳이 된 것은 가장 높은 신이라 할 수 있는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곳이며, 천손이 일본 땅을 내려올 때 그 표식으로 가져온 세 가지 신물 중 신성한 검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츠타, 태초의 예술
신성한 장소로 가는 통로인 아츠타熟田 역은 작고, 깔끔했습니다. 첫 만남은 이미 해가 넘어가 어둠으로 빠져들 때였고, 하늘에는 맑고 푸른빛의 달이 떠있었습니다. 참 조용한 동네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둘레둘레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길을 따라 조금 나오면 큰 도로가 나오고, 그 건너편으로 어둡게 웅크리고 있는 숲이 보입니다. 그 숲의 맞은편으로 길게 지붕과 상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고, 인적은 드믄 상가였습니다.

철제 셔터에 붙어있는 진한 녹과 비스듬히 내려오며 걸린 만국기에 찌든 때와 상가의 지붕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미를 하나하나 새겨집니다. 그렇게 무심히 스쳐갔을 상가를 천천히 둘러보니 무미건조하고 단호하게 내려온 셔터의 표정이 무척 다채롭다는 걸 깨닫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람이 떠난 뒤의 상가 골목은 스산하기 마련입니다. 벗겨진 파란 칠과 경계를 허무는 녹이 희미한 전등과 함께 사람들의 접근은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철제 셔터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자신의 일을 마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리고 싶어 하는 어설픈 상인의 마음이 차디찬 철판 위에 거칠지만 꼼꼼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철제의 커다란 벽은 간판이나 포스터가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예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태초에 예술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것들을 표현하는 거친 손길들이 모여,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문화를 나타내는 예술로 조금씩 발전했을 것입니다.